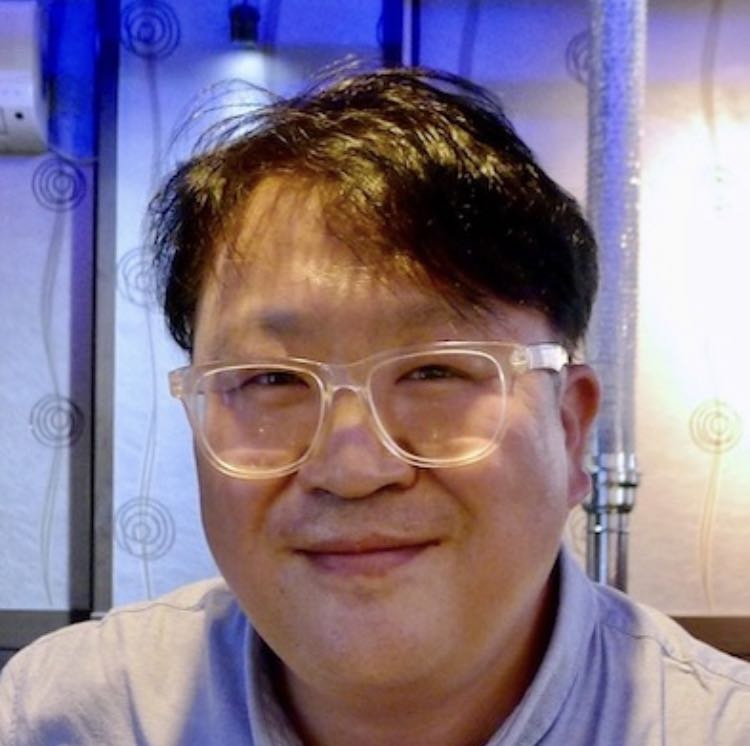Poohsi
한국어 속 한자어, 그 기원과 정체성에 대한 성찰 본문

한국어 속 한자어, 그 기원과 정체성에 대한 성찰
엄익상
어떠한 언어든 어휘 체계는 외래 요소에 가장 쉽게 노출되고, 감염되기 쉬운 부분이다. 한국어도 예외는 아니다. 수세기에 걸쳐 중국과의 밀접한 문화적 접촉은 한국어에 대량의 한자어를 도입하게 만들었다. 한자어는 단지 외래어가 아니라, 한국어 어휘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일본, 베트남은 모두 과거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한자어를 글말 표기 수단으로 차용했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히 문자만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 그 소리마저 통째로 차용한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 약 1,400여 년 전, 한국은 중국 중고음 시기의 어휘와 독음을 받아들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학술 용어나 일상 언어 곳곳에 남아 있다.
중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한자어들은 이미 중국의 지역 방언이 아닌, 각 나라의 고유한 언어 체계 안에서 변형되고 정착된 독립된 언어현상이다. 중국 언어학자 왕력은 이를 ‘외어차사(外語借詞)’라 부르며, 한국어의 한자어를 ‘조선차사(朝鮮借詞)’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 한국어의 한자어는 ‘중국어 역외방언(Sinoxenic dialect)’에 해당한다.
실제로 한국어 사전에 실린 어휘의 약 60~70%는 한자어이다. '우리말 어휘 사용 빈도 조사'(이용주, 1974)에 따르면 전체 낱말의 70% 이상이 한자어였다. 고유어보다도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자어가 단순한 차용을 넘어 한국어 내부에서 고유어와 병존하며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한자어는 원어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한국어 체계에 맞게 의미나 형태, 품사 등이 변형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전파가 아닌 창조적 수용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언어 현상이 단지 차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 고대사와 언어사, 그리고 우리의 민족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 깊은 연결 고리를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자의 기원으로 알려진 갑골문은 商나라 시대에 창제된 것으로, 이 나라는 동이족이 중원으로 진출해 세운 나라로 평가된다. 이는 곧 우리 민족의 조상과 상나라 민족 간에 혈연적·문화적 연관이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갑골문에서 점을 치던 거북이의 이름, ‘거북’이라는 단어조차 한자의 발음 ‘龜(구)’와 점을 치다는 의미의 ‘卜(복)’이 결합된 듯한 모습을 띤다. 이는 단지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도 정교한 언어적 흔적이다.
뿐만 아니라 고대 한어의 발음과 현대 한국어의 고유어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성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 ‘衆生(짐승)’은 2천 년 전 중국어에서 ‘짐승’처럼 읽혔고,
- ‘歲(세)’는 ‘설’, ‘섣’, ‘살’ 등으로 남아 ‘섣달’, ‘설 쇠다’ 같은 표현으로 계승되었다.
- ‘時(때)’, ‘蟲(좀)’, ‘躬(금)’ 역시 현재 한국어 고유어와 대응되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음운적 유사성을 넘어, 언어의 깊은 층위에서 공통된 뿌리를 가리킨다. 2,000년 전 고대 한어의 문장 종결어 ‘也(댜)’, ‘矣(디)’는 오늘날 한국어 종결어 ‘다’, ‘지’와 거의 유사한 음운 구조를 갖는다. 평안도 방언에서는 여전히 ‘지’를 ‘디’로 발음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한 언어의 차용이라는 관점을 넘어, 동아시아 고대 언어사 속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특히 상나라 당시의 언어가 깊은 친연 관계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필자는 이에 근거하여, ‘상나라를 세운 동이족이 바로 우리 민족의 조상이며, 이들이 한자 창제의 주역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만약 우리가 근대사에서 ‘광주기억’이나 ‘천진 해방’에 참여한 몇몇 조상들의 존재만으로도 민족적 자긍심을 느낀다면, 한자의 창제와 발전에 있어 우리 조상의 참여 가능성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자를 쓰는 것이 민족적 자존심을 해친다고 보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 창제와 전파의 역사 속 주체 중 하나였을 가능성을 되새긴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다.
한국어 속의 한자어는 단지 외래어가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언어적 유산이며, 동시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뿌리를 이해하는 일은 단지 언어학적 의미를 넘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이어질 것이다.
1. 역외방언(Sinoxenic dialects)의 개념
-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은 중국과의 오랜 문화 교류를 통해 중국 한자어를 자국어 체계 안에서 받아들여 고유한 방식으로 변화시켜 사용해 왔다.
- 이러한 언어 현상은 중국어 원음과는 다르며, 각국의 언어 구조 및 음운 체계에 맞게 변형되었기 때문에 ‘중국어 역외방언’이라고 부른다.
- **왕력(王力)**은 이를 ‘외어차사(外語借詞)’라고 부르고, 한국의 한자어를 ‘조선차사(朝鮮借詞)’로 정의하였다.
2. 한국어 한자어의 특징과 비율
-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비율은 매우 높으며,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어휘의 약 70% 이상이 한자어이다.
- 이러한 한자어는 단순히 차용된 것이 아니라 한국어 어휘 체계 내에서 고유어와 대립하는 독자적 지위를 형성하였다.
- 또한 형태·의미·품사 면에서 변화를 겪으며, 원래의 중국어와 차이점도 나타낸다.
3. 상나라와 한자의 기원에 대한 민족적 관점
- 상나라(商)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로, 현재의 한자(漢字) 문명의 출발점이라는 견해를 제시.
- **갑골문(甲骨文)**의 점복 문화와 '거북이=구(龜) + 복(卜)' → '거북'이라는 말이 우리말과 연결된다는 해석을 통해, 상나라 문화와 한국의 연관성을 주장.
- 고대 한어와 한국어의 유사성 사례 (예: ‘衆生-짐승’, ‘歲-설/섣’, ‘時-때’ 등) 들을 통해, 언어적 연속성을 제시.
4. 고대 한자문장의 종결어미와 한국어의 유사성
- 예: 王道之始也 → 왕도지시다
- '也', '矣' 등 고문에서의 종결어는 한국어 종결어미(다, 지 등)와 발음이 유사하여 두 언어의 친연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
- 고문 맹자의 예문을 통해 고대한어의 교착어적 특징과 우리말 종결어미와의 대응 관계를 보여준다.
5. 민족 자부심과 한자어에 대한 태도
- 일부 한국인들이 한자와 한자어를 배척하는 경향은 ‘외국 문자 = 종속’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
- 그러나, 글쓴이는 오히려 한자 창제 및 고대한어의 주역이 우리 민족일 수 있다는 시각을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
요약하면:
이 글은 한국 한자어가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깊은 뿌리를 가진 현상이며, 때로는 공동의 기원까지 추정 가능하다는 강한 주장과 함께, 이를 민족 정체성과 연결하여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정리해서 학술적으로 다듬거나, 발표용으로 요약해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시려는 건가요